 |
[조문익] 어느 농촌 활동가의 죽음2006.03.10 12:28 [조문익] 어느 농촌 활동가의 죽음 ▣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밖에서는 노동운동가면서 왜 집에만 오면 가부장이 되는 걸까? 운동이 일상을 끌어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조문익(43)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이 2월7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기 전까지 깊이 고심했던 주제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거쳐 90년대 노동운동의 한길을 걸어오며 ‘치열한 투사’ ‘논리정연한 이론가’로 꼽혀왔던 조씨는 “노동운동의 활로는 생활운동,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언론·지역·생태·여성운동 등과의 연계점을 모색해왔다. 그가 지난해 5월부터 문을 연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의 논실마을학교(www.nonsil.ne.kr)는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생활 공동체이자 조씨의 살림터이기도 했다. 조씨는 숨지는 날에도 논실마을학교가 들어서 있는 폐교의 용도변경 문제로 군청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폭설로 버스가 다니지 못해 눈길을 걸어서 오다가 제설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애초에는 낙후된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공동체 운동을 하겠다는 포부로 이곳에 둥지를 틀었으나 ‘낮은 곳’에 예민한 조씨의 눈에 인근에만 200여 명에 이르는 이주여성들이 계속 밟혔다고 한다. 대부분 필리핀 출신인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은데다, 빈곤과 고된 노동과 외로움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었다. 몇몇은 “노예 같고 지옥 같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조씨는 우선 ‘말이 통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어 한국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주민들에게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인으로 살 것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과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선전·선동’을 꾸준히 해왔다. 논실마을학교는 1년도 안 돼 지역민들의 공부방이자 사랑방, 문화·놀이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씨의 폭넓은 경력과 인간관계가 큰 밑천이 됐다. 조씨와 함께 활동해온 김준근(34)씨는 “세상의 여리고 아픈 곳을 누구보다 먼저 살피고 보듬고자 했던 따뜻한 선배였다”고 그를 기린다. 유족으로는 아내 이현선씨와 두 아들 용화, 용창이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장례위원회를 꾸려 2월11일 ‘고 조문익 민주노동열사장’을 치렀다. [한겨레21]2006년02월16일 제597호. 댓글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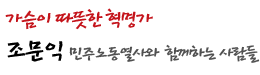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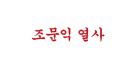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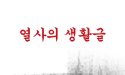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