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우에게 2010.04.14.수-목련꽃2010.04.15 01:06  2010.04.14.수.흐림 목련꽃 널 만나 황홀했다. 올 겨울은 왜 이리도 지긋지긋하게 길었던 것이냐 푸른 생명이 그리웠다. 잿빛 황사 회오리 삭풍을 조롱하고 찬란한 개화로 세상에 항변했지. 고고한 자태로 초봄을 노래했다. 그런 네가 좋았다. 아- 너 없는 새벽 하늘에 넋 놓고 서 있다. 홀연히 떠난 그댈 찾아 어디로 갈까나. -분명 천지 조화였다. 우수수 졌다. 한꺼번에. 사무라이 할복하듯. 패왕별희 항우 오천군사가 저러했을까? 처절한 군무였을 것이다. 망연자실, 난 한동안 정신없이 한 잎 남기지 않고 져버린 목련나무 아래에서 낙화 몇 송이를 멍하니 바라다 보고 있었다. 어젠 종일토록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동백꽃은 핏빛으로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 옆 목련은 흔들림없이 꼿꼿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장해보였다. 황홀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상실감이 덮쳐왔다. 가슴이 깊숙하게 저려왔다. -안과를 다녀왔다. 병원에 들어서니 간호사가 하는 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신다. 그렇구나. 내가 아버님이라고 불리우는 나이가 되었구나. 새삼 느꼈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삶이 고빗길을 넘어서고 있구나. 한 아파트에 사는 의사는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속눈썹이 껄끄럽다며 손질도 해주고 치료실로 옮겨서 마사지도 해주고 눈이 호강했다. 치료 간호사의 손길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언제나 이질감으로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된다. 눈이 붕 떠있다. 세상은 두껍게 보이고 글자는 흐릿하고. 머리까지 무거우면 안되는데. 집으로 들어와 일찍 잠에 취했다. 댓글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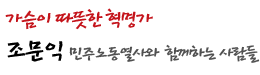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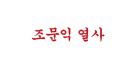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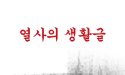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