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우에게 (10.02.17)-고 장재술 선생 5주기 /고재성 선생 징계 학부모 학생 교사 면담2010.02.18 10:01   2010.02.17.수.맑음 고 장재술 선생 추모 5주기 형- 해질녘 강정리 묘역은 평화롭습디다. 저 멀리로 붉은 노을이 서녘바다를 포근히 감싸고 형은 언제나처럼 고운 얼굴로 잠들어 계십디다. 형 가신지 벌써 다섯 해가 지났구료 떠나신 날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동지들은 애통한 가슴으로 말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형- 5.18묘역의 준승 형은 만나보시었소? 해직 넷 중 두 형이 가시었으니 남은 영효 형과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효 형은 지금 장흥 어느 숲속에 오두막집 짓고 홀로 사신다오. 그는 건강의 달인이 되어 여기저기 강좌가 많습니다. 저 또한 형께서 못 다 이룬 꿈 평등 평화 새 세상 향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꼼지락거리며 하루하루 지탱하고 있습니다. 형- 구로리 양계장 생각납니다. 닭똥 치우는 일이 해직시절 우리의 노동이었지요. 형의 계란은 학교방문의 좋은 소재였고 우리는 그렇게 현장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부지런한 형- 복직하고 어느 날 형은 위암 판정 두 번 세 번 대수술을 했고 천신만고의 역경을 겪으며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끝내 형을 불러들이셨어요. 형- 세상은 우리가 횃불 들고 해방을 외쳤던 그 때로 다시 돌아갔다고들 말합니다. 독재회귀- 87, 88 노동자 대투쟁의 민주역량은 성찰의 힘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채 지난 10동안 꾸준히 까먹었습니다. 이제 20년 혹은 수 십 년 퇴행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진보의 게걸음이 답답하기 한이 없지만 역사가 그러다가도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형은 보이시지요?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나아가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에 몸을 떨면서 형 앞에서 이렇게 염치없이 고개만 숙입니다. 장 보스코- 형의 수첩에 적힌 이름 장 요한 보스코- 선한 걸음 선한 눈 장재술 형 보고싶은 재술 형- -1956년 12월 16일 생, 2005년 2월 15일 선종. 홀로 추모식을 가졌다. 청계 강정리 천주교 묘역. 혼자서라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안동지회가 조직되지 못했다. 이번 주나 다음 주말에 조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와 만났던 청계중학교. 1987년 대선이 있었던 그 해 나는 일로여중에서 교련탈퇴운동 주모로 88년 2월에 정년 예정인 교장에 의해 강제전보로 쫓겨났다. 청계중에서 만난 장재술, 그는 너무도 선한 사람이었으며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청계중학교 평교사협의회를 만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청계중학교 분회를 만들고 그랬다. 무안교협 사무장을 맡았던 그는 관료들에겐 무서운 존재. 밤낮없이 전화해서 찾아가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불의에 저항했던 의로운 사람. 임의단체였던 교협의 지위로 우리는 단체협약을 해냈고, 합동으로 신년 장학계획서를 제작하자고 합의하기까지 했다. 그 중심에 장재술 선생이 있었다. -오전 10시. 고재성 선생 징계 관련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 10여명이 도교육청을 방문했다.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부교육감이 청사를 빠져나가버려서 우리의 분노를 샀다. 우리는 교육국장실로 몰려올라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다. 교육부차관이 광주공항에 온다나 어쩐다나 했다. 그렇다하더라도 장학진에서 보고했을 터이므로 잠깐이라도 민원실에 들러 공식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우니 국장과 대화하라고 말해주면 될 것을 민원학부모들을 면상에서 깔아뭉개는 행정을 자행했으니 참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나는 일부러라도 고성으로 강하게 성토하고 항의했다. 이건 교육철학의 문제다. 전남교육수장의 철학이 이 정도라면 전남교육이 제대로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니 옆에 서있던 장학진 중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만나 뵙고 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제가 부감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그가 보기에도 부교육감의 처사는 상식을 벗어난 짓이었다는 뜻. 대표로 아버님, 어머님 한 분씩 오셨는데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하신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고 교사의 참교육 열정을 전하고 국장을 위시한 배석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나와 전봉일, 고재성, 김명종 선생은 바깥에서 기다렸다. 면담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표정에서 다들 나름대로 만족해하는 바가 읽혀졌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댓글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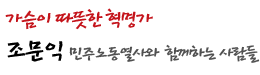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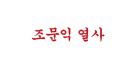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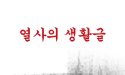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