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어느 행려병자의 독백/1984/조문익2006.03.11 13:38 어느 行旅病者의 독백 나는 행려병자. 시대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몸값만이 똥금인 시가에 하나, 둘 몸을 일으키면 세월에 베인 상흔을 보듬고, 손바닥만한 따뜻함을 찾아 연신 손을 문지른다. 역전 시계탑은 여전히 또각또각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지만 삽이 있어도 굶기는 마찬가지. 소주 몇 잔과 순대 두어 조각이 내 믿음의 전부, 평생 손금만큼 애끼던 모든 것들 수몰지에 버리고 고향 떠난지 이미 십년. 나락을 감싸 나르던 이 팔, 손, 손가락 만이 가로수만큼 앙상한테, 가로수는 추운 바람에 떨고, 아아 날벼리고 걷는 사람들의 둔탁한 구둣소리. 댓글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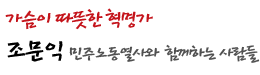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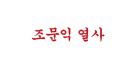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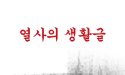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