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를 올리기전에 나를 돌아본다(1)2006.03.11 13:50 봉화를 올리기전에 나를 돌아본다(1) - 이윤보다 인간을! / 주민 민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민중은 참으로 별볼일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만나는 민중들은 비겁하고 비루하고 가난하고 전망없고 문제가 많은 모순에 가득찬 인간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운동은 민중들을 무엇인가 결핍되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로서 전제하고 그들의 공백과 공허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나는 활동가들과 민중들 사이에 현재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외롭고 슬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동 마인드만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혹시 더나아가 어찌보면 구태의연한 ‘의무감으로 운동하는’ 슬픔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착취와 소외가 객관적 현실인 우리 사회에서 슬픔과 외로움은 온 세상에 공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롭고 슬프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활동가들과 민중들은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외롭고 슬프기만 해야하는 것일까? 아닌 것 같다. 민중을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된 인간군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애정없는 비과학 같다. 인간들은 모두 부족하지만 동시에 충만한 존재다. 민중들은 결핍에 목말라하지만 항상 나누어 쓸만한 용기와 풍성한 마음을 갖고있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 농민들과 얘기 나누는 경우, 어민들과 함께 어울릴 경우 우리는 그들의 힘을 보곤한다. 그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동으로 운동을 이어간다. 요즈음은 대중들이 자신의 이런 진솔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각박한 신자유주의세상이 되어 힘들기는 하지만 민중을 이런 관점에서 대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활동가와 민중들이 만나서 함께 호흡하는 과정으로서의 운동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만한 것이어야한다. 아니 하고싶은 것이어야한다. 지속가능한 운동은 의무감으로 이어지기가 쉽지는않다. 드물게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16세기 이야기다. 외롭고 슬픈 활동가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즐겁고 신명이 넘치는 활동가가 세상을 바꾼다. 하나의 인간이, 매우 뛰어난 활동가라하더라도 다른 인간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가? 아마도 드물게는 있겠지만, 그 조차도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본래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해있어서 서로서로 교통하는 과정에서 잠재된 힘이 솟구치는 것일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산파’에 비유하였다. 자신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조력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는 다른 이의 아이를 낳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이를 낳을뿐이다. 활동가끼리도 마찬가지이다.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좋다가도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인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활동가가 싫어질때도 있다. 이떤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의 문제점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공감할만한 문제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양반이 잘못한 것 같네. 그런데 말이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간은 없고 흠집투성이인 인간들만 득시글대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나 문제의식에 완전히 합치하는 인간을 내어놓을까? 만약 무결한 인간들만 아웅다웅대는 사회가 되면 부복함 투성이인 나는 어떻게 끼어들어 살아갈까? 인간은 원래 부족한 것이다. 본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힘들다. 왜? 항상 날을 새우고 살아야하니까. 어떤점이 부족한가를 살피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다. 왜 그 인간의 부족함을 보는가?하는 것이 달라져야하는 것이다. 너는 이게 문제야!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는게 아니라 그 인간이 보다 풍부해지는데 어떤 부분을 채워야하는 가를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탐구해가는게 인생이다. 대부분 항상 함께 사는 처지가 아닌 바에야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못내서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아니던가? 일을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처지라면 기회는 그만큼 많다. 만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다. 나자신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원칙을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동지는 욕하지 않는다. 다만 살아가며 조언할 뿐이다” 가능하면 이 원칙을 입장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늘상 만나는 민중들은 사실 더 이상한 논리를 갖고있는데도 해해거리면서 밥을 나누는데, 그양반들하고는 왜 안될까하는 것이 요즈음 내 고민이다. <노자도덕경> 한구절에 ‘곡즉전(曲卽栓) 규즉영(窺卽盈)’이라는 구절이 있다. “굽어있으니 펴지는 것이요, 비어있으니 채워지는 것이다”라는 뜻이란다. 나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민중의 본질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무릎을 탁 칠정도의 명구이다. <장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못생긴 나무가 고향을 지키는 이야기다. 비루하고 못난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본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지킨다. 잘난 존재들은 아마도 지구아닌 다른 별로 옮겨갔거나 옮기고 있는 중일거다. 우리는 지구인이고, 한반도에 태어났고, 한낱 부족하기 이를데 없는 민중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세상이야말로 변혁의지를 가진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고, 항상 결핍으로 갈구하는 민중들이야말로 가능성의 화신이다. 사회의 부조리는 사회변혁의 동인으로 전화하고, 인간의 부족함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전화한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가? 무한수용, 무한노력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전화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부족한 활동가들이고 모자라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학이 맞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꿈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믿는다. 스스로를 믿지않고서야 어찌 세상을 믿겠는가? 그러므로 꿈★은 이루어진다.(2006. 1. 12 새벽) 댓글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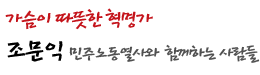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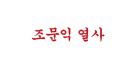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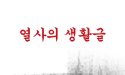 |
 |
 |
